
다시 오마 빈말 남기고 떠난 뒤엔 뚝 끊은 발길
달은 누각 위로 기울고 새벽 알리는종소리만 들려오네요
꿈속, 먼 이별에 울면서도 그댈 부르지 못했고
다급하게 쓴 편지라 먹물이 진하지도 않네요
촛불은 희미하게 비췻빛 휘장에 어른대고
사향 향기 은은하게 연꽃 수 이불에 스미네요
선녀 그리며 유신(劉晨)은 봉래산이 멀다 한탄했다지만
우린 봉래산보다 만 겹 더 떨어져 있네요
來是空言去絶蹤, 月斜樓上五更鐘. 夢爲遠別啼難喚,
書被催成墨未濃. 蠟照半籠金翡翠, 麝薰微度繡芙蓉.
劉郞已恨蓬山遠, 更隔蓬山一萬重.
―‘무제(無題)’ 이상은(李商隱·812∼858)
작별 후 발길 끊은 임을 향한 원망의 노래. 다시 온단 약속이 빈말임이 증명되었지만 애써 부정하고 싶을 만큼 가슴앓이가 이어진다. 그(녀)가 상대를 가슴에 품고 놓치지 못하는 사이, 새벽종이 울리고 있다. 꿈속에서 잠시 만난 듯도 한데 어느새 멀어져 간 시간들이 고통스럽기만 하다. 미몽(迷夢) 속에서 반짝 떠올린 해결책은 편지. 한데 왜 먹물을 제대로 갈지도 않고 써 내려갔을까. 애틋한 그리움에 평정심을 잃은 탓일까. 아니면 편지를 전해줄 누군가가 다급하게 채근이라도 했을까. 방 안의 적막을 한결 도드라지게 하는 건 ‘비췻빛 휘장과 연꽃 수 이불’. 지난날 함께했던 이 사랑의 징표 때문에 임과의 거리는 더한층 아득하고 막막하다. 헤어진 선녀를 찾으려던 선비 유신은 선녀가 머무는 봉래산이 멀다고 한탄했다는데, 그보다 만 배나 더 아득한 우리 사이는 어쩌란 말인가.
이상은 시 특유의 몽환적 분위기와 메타포가 깔린 작품이다. 꿈속과 생시를 넘나들고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허물어진다. 현실과 전설 속 인물이 교차하고 급기야 시적 화자의 성별마저 모호해졌다.
이준식 성균관대 명예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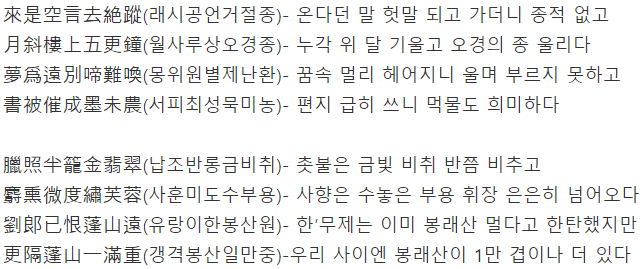
'이준식의 한시한수'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무욕의 에고이즘[이준식의 한시 한 수]〈166〉 (0) | 2022.06.24 |
|---|---|
| 초여름의 정취[이준식의 한시 한 수]〈165〉 (0) | 2022.06.17 |
| 초승달의 꿈[이준식의 한시 한 수]〈163〉 (0) | 2022.06.03 |
| 봄날의 회한[이준식의 한시 한 수]〈162〉 (0) | 2022.05.27 |
| 어떤 한풀이[이준식의 한시 한 수]〈161〉 (0) | 2022.05.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