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제국과 평화 사이

북관(北關·함경도) 지역에서 활약한 인물을 그린 ‘북관유적도첩(北關遺蹟圖帖)’에 실린 ‘야연사준도(夜宴射樽圖)’. ‘밤에 잔치를 하던 중 술동이에 화살이 꽂히다’라는 뜻으로, 6진 개척으로 알려진 세종대 김종서의 일화를 그렸다. 조선시대 북방은 몇 사례 소동이 있었지만 대체로 평온했다. [사진 고려대박물관]
조선 태종 7년(1407) 5월 1일, 중국 명나라 영락제는 조선에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다. “안남(安南)의 진일규(陳日煃)는 의리를 생각하고 문화를 지향하여 솔선해 공물을 바쳤다. 근래 호일원(胡一元)이 임금을 죽이고 백성을 병들게 하여 원성이 길에 가득했다. 부득이 군사 80만을 거느려 토벌하게 했다.”
북방 수비하는 군사비 부담 줄어
당대 중국·일본에 비해 크게 낮아
상비군 부족한 조선, 임란 때 곤욕
동북아 평화 어떻게 찾아야 하나
안남은 지금 베트남 땅에 있던 나라다. 영락제는 1406년 진 왕조를 전복하고 등장한 호 왕조를 정벌한다는 명분으로 안남을 공격했다. 동원된 군사는 80만이라고도 하고 20만이라고도 한다. 명나라 군대는 엄청 고생했다. 아무튼 1407년 호 황제를 사로잡아 남경으로 압송했지만, 당시 사령관 장보가 1년 뒤에나 명나라로 귀국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으로 조서를 보낼 당시 베트남 사태가 진정된 것은 아니었다. 영락제는 베트남 정벌이 채 수습되지 않는 상황에서 ‘안남을 평정했으니, 조선은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허풍과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제국의 불안감이고 의심이다.
명 태조 “조선은 정벌 말아야 할 나라”

조선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사진 고려대박물관]
여말선초 요동(遼東) 정벌 논의에 이어 실제 군사행동에 들어간 적이 있었다. 위화도 회군으로 무산됐다. 요동을 사이에 두고 조선은 명나라와 적대적 행위를 피할 수 있었고, 곧 두 나라의 조공 관계가 유지됐다. 명 태조 주원장이 후대 황제에게 남긴 훈계인 『황명조훈(皇明祖訓)』에서 ‘정벌하지 말아야 할 나라’로 15개국을 들고, 조선을 맨 먼저 꼽은 까닭일까. 왕자의 난 전후로 조선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며 토벌을 청하는 병부(兵部)에 대해서도 명 태조는 ‘전쟁은 재앙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명나라는 조공을 제외하면 조선의 국내 사정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 두 가지 증거가 있다. 하나는 흔히 종계변무(宗系辨誣)라고 부르는, 이성계의 가계가 고려 권력자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잘못 기록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다.(권문세족인 이인임 일파는 이성계에게 밀려났다) 조선 건국 초에 문제가 된 일이 1589년(선조22)에야 해결됐으니 무려 200년이 걸렸다. 다른 하나는 임진왜란 때 원군으로 왔던 명나라 원황(袁黃)이 조선에 『경국대전(經國大典)』이 있음을 알고 얻어가려고 했던 일이다. 명나라는 이 법전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고, 조선은 이 책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태조 이성계
명나라와 주변국 관계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에서 조공이라는 외교, 국제 관계가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 국왕이 즉위하면 명 황제가 주는 임명장인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책봉의 의례성이다.
임진왜란은 조선과 명나라의 외교 관계를 확증했다. 명나라 입장에서는 순망치한(脣亡齒寒), 즉 입술인 조선이 무너지면 바로 자신들이 다칠 것이라는 자국의 이해에 대한 실리적 고려가 있었다. 또한 조선과의 평화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 및 조공국에 대한 책임감도 있었다. 한편 조선이 일본과 공모하여 명나라를 침략하려고 한다는 의심도 끼어들었다. 결국 전통적 우호 관계를 고려하여 파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가 됐다. 이 복잡성과 긴장의 경험을 빼고는 ‘춘추대의(春秋大義)’니, ‘사대(事大)’니 하는 관념을 이해할 수 없다.
사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맹자(孟子)는 흥미롭게도 사소(事小)를 말한다. “큰 나라인데 작은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天理)를 즐거워하는 일이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은 천리를 두려워하는 일이다. 천리를 즐거워하는 자는 천하를 보전하고, 천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나라를 보전하리라.”

세종
사소에 대한 맹자의 착상이 중화(中華)-이적(夷狄) 질서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단언할 수 없다. 허나 중국과 주변국의 지정학적 조건에 적용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명과 조선, 혹은 명과 안남 식의 1대 1이라면 명의 대응은 비교적 쉬울 수 있다. 그러나 1 대 다(多·때에 따라 20개 이상의 주변 나라나 종족)라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 사소(事小)하지 않으면 강대한 제국인들 무슨 수로 천하를 보전하겠는가.
조선 초기, 명나라 사신은 조선의 토지세 징수와 군사 제도에 대해 묻는다. 조선은 명과 달리 평소에 농사를 짓다가 때가 되면 군사로 차출하는 병농일치를 시행한다는 말에 사신은 아주 흡족해하면서 돌아갔다. 제후국인 조선이 상비군을 갖는 것은 매우 위협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조선의 군사제도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했다. 당시 조선은 상비군이 적었고 관군은 교대로 입대하는 농민군인 육군과 수군을 중심으로 편제됐다. 정규군의 불균형은 의병이 메웠다)

명 태조
각각 상비군과 병농일치로 특징지어진 천자국와 제후국의 상이한 군사 제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18세기 동아시아 상황을 놓고 살펴보자. 『청사고(淸史稿)』에 나오는 15개 항목의 청나라 세출 예산을 보면, ‘만한병향(滿漢兵餉)’, 즉 만주족과 한족으로 구성된 팔기군 등 황제 직속부대와 정예부대 20만 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사비가 중앙재정의 49%를 차지했다. 또한 변방 각 성(省)에 지원하는 군사 비용인 협향(協餉)이 지방재정의 29%를 차지했다. 이렇게 보면 전체 재정 중 군사비가 50%를 훌쩍 넘게 된다. 전시가 아니라도 청나라는 국방을 위해 항상 경비 태세를 갖춘 군대를 유지했다. 거기에 주변 제후국이 외부의 침략을 받으면 보호할 의무까지 져야 했으니, 전쟁이라도 나면 군사비는 비약적으로 늘어날 것이었다. 조금 나아졌던 명나라 재정이 임진왜란에 참전한 뒤 곤두박질쳐서 나라가 망하기에 이른 것은 그 때문이었다.
임란·호란 제외하면 대외관계 안정적

명 영락제
에도 막부 시절의 일본은 어떠했을까. 18세기 에도 막부는 군비, 즉 무사(武士)에게 지불하는 ‘절미(切米)·역료(役料)’가 재정의 42%에 이르렀다. 전국을 통합한 에도 막부 재정은 직속 가신(家臣)의 군사력과 농민의 공물 납입을 기반으로 집권 권력을 유지했다. 그렇더라도 무사를 정점으로 하는 신분제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군비는 영주-봉건제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필요했다. 19세기 막부 말기 무사에게 지급되던 절미·역료의 비중이 28%로 떨어지면서 무사 계급이 몰락했고, 에도 막부 역시 사라져갔다.
한편 조선은 국역(國役·나라에 지는 의무)으로 이루어지는 노동력 징발(군역·직역·향리 등)과 군포(軍布)나 쌀 납부 같은 현물납, 기타 인건비를 지출해야 했는데, 군사 기관의 재정이 속한 세출 항목인 병전(兵典)에는 재정 세출이 19%에 해당했다. 이것도 수도 경비를 위한 재원이 대부분이었으므로 ‘국방비’ 성격으로 보기는 어려웠다. 또 기관 자체의 유지비도 포함돼 있어 ‘군비’로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 지방의 병영(兵營)과 수영(水營)을 고려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와 같이 청나라나 에도 막부의 재정과 비교할 때 조선의 군사비 지출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조선은 세종 때 4군 6진을 정비하면서 여진족과 충돌한 이래로 간간이 변방의 전투가 있었지만 대체로 북방과 평화를 유지했다. 후금-청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다. 청나라와 두 차례 호란을 치른 뒤 다시 200년 이상 북방은 평화로웠다. 북방을 지켜야 하는 군사비가 적게 들었다는 뜻이다. 조공-책봉 체제의 평화의 경제적 효과였다. 제국은 사라지고(사라졌다고 믿고) 대등한(대등하다고 믿는) 국민 국가들이 어깨를 비비는 동아시아는 과연 평화로운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세계 10위권 한국, 약한 평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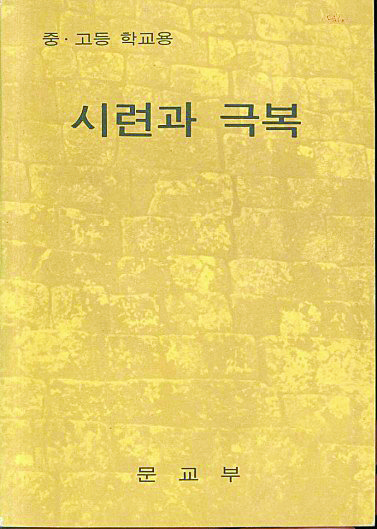
시련과 극복
1970년대 『시련과 극복』(사진)이라는 중고등 교과서가 있었다. 늘 침략만 받고 시달린 ‘민족사’를 주입하며 약소국 콤플렉스를 만들어내던 시절, 그래서 안으로 ‘단결’을 외치며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수탈을 합리화하던 이데올로기가 있었다.
과연 전 세계 역사에서 500년 동안 두 차례의 침략 전쟁만 겪었던 문명이 있었는가. 전쟁은 직접적으로 멀쩡한 젊은이들이 몸을 상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짜는 재정 지출을 수반한다. 그걸 피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은 당연하다. 특히 기성세대에게는 의무다.
동아시아에서 조선이 작은 나라가 아니었다. 아니 명나라가 볼 때 중국 다음으로 큰 나라였다. 지금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도 정치의식-경제-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큰 나라이다. 약소국 운운하는 찌든 생각을 벗어나 국제적 위상에 맞는 책임과 비전을 보여주는 나라를 만들 때다.
오항녕 전주대 역사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출처: 중앙일보]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조공·책봉의 관계, 평화·경제효과도 있었다
'오항녕의 조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기우제 지낸 유학자, 절 짓는 사대부 많았다[출처: 중앙일보] (0) | 2021.08.09 |
|---|---|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사관의 붓은 공론의 시작, 왕·관료들에 ‘떠든 아이’ 효과[출처: 중앙일보] (0) | 2021.04.30 |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농지와 산림은 만인의 자산, 민생 바탕 다졌다[출처: 중앙일보] (0) | 2021.04.30 |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4~5인 자영농이 대세, 아들딸에 균분·분할 상속했다[출처: 중앙일보] (0) | 2021.04.30 |
| [오항녕의 조선, 문명으로 읽다] ‘열하일기’ 박지원의 당당함, BTS의 보편성에 닿다[출처: 중앙일보] (0) | 2021.04.30 |
